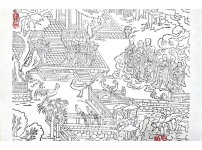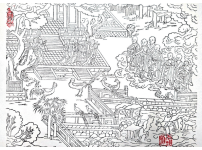智異山 紀行詩 - 河東地域을 중심으로(12)
김지백(澹虛齋 金之白) 武陵橋(무릉교)
- 제 12 호
본문
역자(譯者) 정경문 (茗谷 鄭慶文)
-무릉교-
千載秦餘一谷開(천재진여일곡개)
오랜 세월 선경이 한 골짜기에 펼쳐져 있어,
武陵橋下客筇回(무릉교하객공회)
나그네 무릉교 아래서 지팡이 짚고 돌아오네.
仙區自有前緣在(선구자유전연재)
신선의 고장은 본래 지난날 인연이 있었으며,
不獨漁郞逐水來(부독어랑축수래)
물길을 찾아가는 길은 어부뿐만이 아니라네.
○ 말구(末句)에 주자(朱子)의 무이구곡(武夷九曲) 詩 “어부 가 다시 무릉도원 가는 길을 찾으니”의 뜻을 채용(采用)하였 다.[末句采用朱子九曲詩“漁郞更覓桃源路”之意]
秦餘(진여) : 진(秦)나라의 병화를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. 어부가 물결에 떠내려오는 복사꽃을 보고 근원을 찾아 도화원(桃花源)에 갔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자, 그들이 “선대에 진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처자들을 데리고 이 외딴 지역에 온 뒤로 다시는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 서 외부 사람들과 단절되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릅니다.” 라고 한 〈도화원기〉의 고사에서 온 말인데, 흔히 선경(仙 境)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. 《陶淵明集 卷6》도원(桃源) 선 경(仙境). 武陵橋(무릉교) : 화개(花開) 신흥리(神興里) 삼거 리 시내에 있었던 다리. 서산대사 휴정(西山大師 休靜)의 《 유무릉동(遊武陵洞)》의 詩가 있다.
仙區(선구) : 신선의 고장. 신선의 땅. 漁郞(어랑) : 어부(漁夫).
次眞上人韻(차진상인운)
-眞상인의 시에 차운하다-
勝地東南似此稀(승지동남사차희)
지리산 동남쪽의 명승지로 이러한 곳 드물고,
客來尋舊一荷衣(객래심구일하의)
나그네 연잎 옷 입고 옛 자취를 찾아서 왔네.
武陵橋下遊仙處(무릉교하유선처)
무릉교 다리 아래는 신선이 노닐었던 곳으로,
鐵笛聲中獨自歸(철적성중독자귀)
쇠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나 홀로 돌아가노라.
勝地(승지) : 경치(景致)가 좋은 곳. 명승지.
荷衣(하의) : 연(蓮)잎으로 엮어 만든 은사(隱士)의 옷을 말한 다. 초사(楚辭) 이소경(離騷經)에 “연잎을 재단하여 옷을 만 듦이여, 연꽃으로는 치마를 짓도다.[製芰荷而爲衣兮 集芙蓉 而爲裳]” 하였다.
遊仙(유선) : 신선이 노는 곳.
鐵笛(철적) : 쇠로 만든 피리로, 은자(隱者)의 피리를 뜻한다. ※ 1655년(효종6) 10월 10일 불일암(佛日菴), 불일폭포(佛日 瀑布), 향로봉(香爐峰)을 구경하고, 다음날[11일] 쌍계사를 떠나 무릉교(武陵橋)를 건너 신흥사(新興寺)의 옛터를 찾아 가 능파대(凌波臺) 주위를 둘러보았다. 거센 물결을 건너 너 럭바위에 이르렀다. 너럭바위 위에 과연 세이암(洗耳巖)이라 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, 글자체가 최치원의 필체와 비슷 하나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. 그리하여 詩 한 수를 읊었다.
김지백[澹虛齋 金之白.1623(인조1)~1671(현종12)].
조선 중 기 학자. 字:자성(子成). 號:담허재(澹虛齋). 本貫:부안(扶安). 居:남원(南原). 文集《담허재집(澹虛齋集)》. 1648년(인조26) 과거에 급제, 진사(進士), 사헌부 집의를 역임. 《유두류산기( 遊頭流山記)》가 있다.